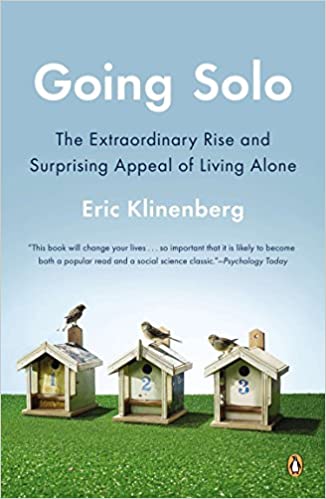
Eric Klinenberg. 2012.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Penguin books. 233 pages.
저자는 사회학자이며, 이 책은 300명 이상의 사례를 인터뷰한 연구 결과이다. 20세기 후반들어 혼자사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에서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65세 이상의 절반이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혼자사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극도로 가난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 20~30대의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으며, 노년기에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편에 있다. 혼자사는 사람이 느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텐데, 북유럽 사회와 같이 인구의 절반이 혼자사는 단계에까지 갈 수도 있다.
근래로 올수록 혼자사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제적 풍요의 결과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함께 살 수 밖에 없었으나, 극도로 가난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이 개인의 소득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덕택에 혼자 살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삶의 성취를 최우선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불행한 결합에서 벗어날 자유를 획득하였다. 사람들은 내키지 않는 상대와 결혼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것을 주저치 않는다.
20세기 후반에 혼자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개인의 감정과 성취을 최우선하는 가치관의 확대, 둘째,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취업 확대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 셋째, 도시 생활의 증가, 넷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쉽고 빈번해짐, 다섯째, 교육 기간이 늘고 수명이 연장되어 노년기가 느는 등으로 생애 주기가 바뀐 점.
혼자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혼자사는 것이 꾀 할만하기 때문이다. 혼자산다고 하여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직장 생활에 바쁜 것은 물론이고, 일 이외에 여가생활에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한다. 혼자 사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는 자유를 누린다는 장점이 있다. 결혼 생활은 잘 되면 좋지만, 갈등할 때에는 혼자사는 것보다 못하다. 결혼한 사람이 혼자사는 사람보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더 좋다는 많은 연구 결과는 잘못된 비교이다. 왜냐하면 결혼했다 문제에 부딛쳐 이혼한 사람을 결혼한 사람의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혼자사는 것보다 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결혼의 실용적 장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착각하고 말하는 것일 수있다.
젊은 시절은 물론이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혼자사는 것은 살만하다. 그러나 노년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어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이 나이가 들수록 다가온다. 몸이 병들고 쇠약해져 타인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필요로 할 때, 친구는 가족을 대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거동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게까지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한다. 미국인들은 양로원을 죽으러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며, 실제로 양로원에서의 삶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만큼 열악하다. 부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반자립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assisted home 에서 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도심에 이들의 주거 수요을 충족하는 소형 주거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혼자사는 노인의 문제는 미국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노인들의 물질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사회가 놓은 사회이다. 미국의 중류층 삶의 전형인 교외의 단독주택은 혼자사는 사람의 욕구와는 어긋남으로 앞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 책은 혼자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혼자사는 것도 충분히 할만한 일이며,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혼자사는 것이 결코 고립된 방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혼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혼자 살다가 때때로 같이 살기도 하고, 원하는 동안 함께 사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의 삶이 일반화된 스웨덴을 이상적으로 그린다. 스웨덴은 빈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면 언제건 혼자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에 혼자사는 방식이 조금도 이상할게 없는 사회라고 한다. 살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참으면서 계속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옛사람의 말은, 살기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로 치부해야 한다. 인생은 한 번 뿐이므로 자유롭게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 죽는게 더 나은 삶이다. 쉽게 읽어 내릴 수 있는 책이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략 (0) | 2021.11.12 |
|---|---|
| 전쟁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0) | 2021.11.06 |
| 휴렛패커드의 기업문화 (0) | 2021.10.16 |
| 인간의 도덕률은 생물학적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0) | 2021.10.14 |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David Packward. 1995. The HP Way: How Bill Hewlett and I Built Our Company. HarperCollins. 193 pages.
저자는 휴렛패커드 회사의 설립자 중 한 명이며, 이 책은 휴렛패커드 회사의 경영과 성장 과정에 촛점을 맞춘 자서전이다. 휴렛과 패커드는 193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으로 만나 이 회사를 설립한다. 두사람 모두 공학도이며, 이 회사의 정체성 역시 기술적 수월성에 두고 있다. 그는 책 전체에서 여러번 휴렛패커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패커드는 생산을 맡았으며, 휴렛은 기술 개발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들은 학창시절부터 서로 자주 교류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여가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체감을 다졌다.
스탠포드 공대의 Fred Turmen 교수는 두사람의 진로과 회사의 설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에게 이끌려 공학을 전공했으며, 신기술에 바탕을 둔 회사 설립과 운영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정밀 전자계측기, 레이더기기, 마이크로웨이브 기기, 정밀 의료기기, 과학 실험기기, 등의 개발과 제조를 주로 하여, 이차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동안 폭발적인 방위산업 수요에 힘입어 회사가 크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중 소비재인 컴퓨터와 프린터 산업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휴렛패커드는 회사의 경영 목표를 주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역사회, 등 회사 관계자(stakeholder) 모두에게 기여하는 (contribution) 데 두었다. 주주 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삶에 기여하는 것에서 회사의 존재의의를 찾았다.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영진과 구성원의 소통을 중시하고, 현장에 가까운 구성원의 적극적 의사 개진을 장려하는 비권위적 기업 문화를 뿌리내렸다. 회사 구성원들은 회사의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있도록 회사 구성원의 창의력(initiative)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휴렛패커드는 의사결정을 분권화한 조직으로 유명하다. 각 부문 장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 운영에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경영자가 회사의 목표에 동조하는 한, 위로부터 세세하게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 경영 원칙을 실현하였다. 중간 경영자는 의사결정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었다. 회사가 관련 기술 분야에서 항시 최선두에 있는 것을 경영의 원칙으로 하여, 회사 매출의 6~10%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쫒아 다른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따라하는 것을 피했다. 회사의 기술 영역과 연관이 크지 않은 분야로 무작정 확장하여 재벌화(conglomerate)하는 것을 피했으며, 과도한 차입 확장을 피하는 대신, 경영자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절약하고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능력에 맞게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가 이 책을 쓸 때까지 휴렛패커드의 고위 경영자는 모두 공학도 출신이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문화를 고수하였다.
저자인 패커드는 회사 경영을 넘어서, 스탠포드 대학의 이사장으로 오랫 동안 재임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국방차관을 하면서 국방부의 무기조달 관련 일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휴렛패커드는 초기 실리콘 밸리의 발판을 닦은 기업으로서, 스탠포드 대학과 산학협동 사업을 시작하여 활성화시켰다. 회사의 기술진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지원으로 스탠포드 대학원의 강좌를 들으며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협동을 통해 회사의 기술진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했으며, 유능한 신진 공학도를 회사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이 책은 미국의 경영대에서 한동안 필독서로 추천되었다. 저자가 서술하는 휴렛패커드의 성장과정과 기업 문화는 매우 이상적이다. 자서전이라는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기술적 수월성을 기업의 정체성으로 하는 경우 최선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휴렛패커드는 이 책이 쓰여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 이전만큼 기념비적 업적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기업환경이 변하였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거대기업이 스타트업만큼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리라. 이 책을 읽으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운도 따라서 큰 성취를 하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쟁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0) | 2021.11.06 |
|---|---|
| 혼자 사는 것도 살만하다. (0) | 2021.10.18 |
| 인간의 도덕률은 생물학적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0) | 2021.10.14 |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Matt Ridley. 1996. The Origins of Virtue: Human instincts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Penguin Books. 265 pages.
저자는 인기있는 과학 저술가이며, 이 책은 인간의 도덕율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파헤친다. 인간 사회의 도덕율의 핵심은 각자 이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본능을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제어해야 하는 딜레마이다.
인간은 생물계의 일원으로서 철저히 개인의 이기적 이익에 따라 살아간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함께 살면서 역할 분업을 통해 전문화의 효율을 거둠으로서 종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집단 생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leman)"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전략이다. 죄수의 딜레마 문제는 공공선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다. 협력보다 배반을 선택하며, 자신이 해야 할 기여를 소홀히 하면서 남의 노력의 과실을 무상으로 누리려 하는 무임승차 (free rider) 문제 등, 사람들이 함께 살 때 당면하는 도덕률의 문제는 모두 동일한 논리를 내포한다.
생물의 진화는 개인간의 경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체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개체보다 자손을 퍼트릴 가능성이 크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게임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즉 거래를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경우, 상대를 배반하는 행위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전략으로 판명났다. 즉 사람들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공동체속에서 살아갈 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전략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선을 위배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며, 공정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공공선을 위배하는 타인을 벌주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즉 인간의 감정 체계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선을 위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장치이다. 이는 진화의 결과이다. 즉 이러한 감정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 구성원이 협력하여 공공선을 잘 구현하는 집단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은 인간을 공공선을 위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완벽한 장치로까지 발달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선을 위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다수가 공공선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집단이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공공선을 위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한결같이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집단의 규율을 어기는 사람을 벌주고 통제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동일시하도록 설득하는 다양한 문화적 장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 헌신, 소속 집단에 충성하는 것 등은 모두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장치이다.
인간은 상호간 교역(trade)을 통해 각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교역 참여자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 아담스미스의 분업이론 및,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교역이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준다. 각자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여 서로 간 교역을 함으로서,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교역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win-win 현상을 가능케 한다. 인간은 국가나 법 규범을 만들기 훨씬 이전의 원시시대 때에도 교역을 했다.
인간이 집단에 소속되어 공공선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성향은, 자신을 소속 집단과 동일시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부족주의'(tribalism) 본능을 낳았다. 부족주의는 자신이 소속하지 않는 타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 차별, 적대감을 가지게 만든다. 인종적 차별에서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부족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된다. 집단이 구성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장치는 집단 간에 갈등을 낳는다. 결국, 집단간 갈등과 전쟁은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 본성을 집단이 규제하는 집단 생활의 필연적 산물이다.
국가와 같은 공공의 규제를 통해서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자원에 대해 개인의 사적 소유를 허용함으로서 각자가 자기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국가과 같은 큰 집단에게 관리를 맡기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결국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한다. 반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소중하게 유지하고 관리한다.
저자는 작은 국가를 선호한다. 국가에게 맡기기보다는 각자 사적인 이익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공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전략이라고 본다. 각자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교역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게 발휘된다. 그러면 낙오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공공의 자원으로 낙오자를 구제하기보다, 개인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의 생산과 배분을 전적으로 각자의 능력과 시장 경쟁에 맡기면 불평등이 심해진다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뒤떨어지는 사람의 지위는 더 열악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손에게 자신의 이익을 물려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은 세대를 거치면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전된다. // 여하간, 저자는 엄청난 독서를 바탕으로 이를 잘 버무려서 논의를 전개하는 재간을 가지고 있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혼자 사는 것도 살만하다. (0) | 2021.10.18 |
|---|---|
| 휴렛패커드의 기업문화 (0) | 2021.10.16 |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Alan Krueger. 2019. Rockonomics: A Backstage tour of what the music industry can teach us about economics and life. Currency. 269 pages.
저자는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이 책은 대중음악 산업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성과물이다. 음악산업은 1990년대에 디지털화되고, 2000년대에 스트리밍 방식이 음악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화된 음악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 때문에 승자독식의 시장(winner-takes-it-all market)을 형성한다. 첫째, 사용자가 늘어도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확장성(scaleablity), 개별 음악가와 음악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uniqueness), 음악의 소비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음악을 소비한다. 남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도 좋아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들에게 추천한다. 사람들이 특정 음악에 선호를 형성하는 방식은, 그와 유사한 것을 많이 접할수록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는 편향성을 띤다. 특정 가수나 특정 곡의 인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연이거나 사소한 원인 때문에 특정 음악에 대해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의 선호가 쌓이기 시작하면, 뒤이어 눈덩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bandwagon effect)이 발생하면서 인기가 높아진다. 성공한 가수나 음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성공이 사소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과 비슷한 역량의 다른 가수나 곡들이 뜨지 못한 경우가 무수히 많다고 고백한다. 음악 소비자들의 취향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 뜰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음악 종사자들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
인터넷 덕분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좋아할 틈새 상품도 빛을 볼 수 있으므로, 소수의 음악에 인기가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되리라는 예측은 틀렸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스포티파이(Spotify)나 애플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모든 곡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음에도, 사람들의 선호는 소수의 곡에만 집중되어 있다. 최상위의 곡이 사람들이 듣는 노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음악 소비가 음악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지극히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1999년에 냅스터가 사람들간에 음악 파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불법 음악 복제 행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99년을 고비로 하여 그 이후 음악 산업 전체의 수입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시간과 수고를 들여 음악을 불법 복제하기보다, 매월 약간의 돈을 내고 서비스를 구독하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불법 복제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음악 산업 전체의 수입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음악 산업의 수입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누리는 효용에 비해 음악 산업이 거두는 수입은 매우 작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파티에 참여하거나, 식사나 운동을 하거나, 등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으로 매일 몇시간씩 음악을 듣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악을 듣기위해 지불하는 돈은 미미하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음악가들은 생계비를 버는 것도 힘겨워 한다.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버는 목적은 부수적이다. 음악가를 지망하는 사람은 매우 많고, 매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음악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수의 스타를 제외하고 음악을 하여 거두는 수입은 미미하다. 많은 무명의 음악가들은 행사에 뛰고, 음악 레슨을 하고, 다른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돈이 벌리지 않음에도 본인이 좋아서 음악을 한다.
음악계의 스타의 수입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소득과 비교하면 현저히 작다. 사람들은 대부분 녹음된 음악을 공짜에 가깝게 듣기 때문에, 인기 음악가들도 자신의 음반으로부터 거두는 수입은 매우 작다. 거의 모든 스타들은 현장 콘서트를 통해 거두는 수입에 주로 의존한다. 음반 판매나 방송국에서 자신의 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인지도를 이용하여 현장 콘서트에 팬들을 모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콘서트에 상당한 수의 팬을 동원할 수 있는 스타는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수입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저자는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면 음악가의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스트리밍 산업의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확실치 않다. 영화와 음악을 함께 묶어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이 다른 본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음악 스트리밍이 계속 기능할 수도 있다. 일단 음악을 제작하면 복제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음악 산업 자체의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음악이 사람들의 일상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음악을 덧붙이는 다양한 방식이 출현하리라 예상한다. 여하간, 현재 음악은 사람들이 누리는 효용에 비하여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 많은 시간을 즐기므로, 사람들에게 큰 복리를 제공한다. 이 책은 광범위한 자료와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중 음악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질 높은 연구 성과이다. 이 책을 통해 음악 산업 전반에 눈을 뜨게 됬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휴렛패커드의 기업문화 (0) | 2021.10.16 |
|---|---|
| 인간의 도덕률은 생물학적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0) | 2021.10.14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 질병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 2021.09.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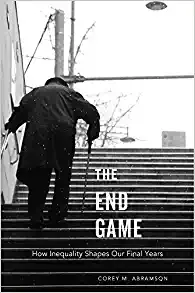
Corey Abramson. 2015. The End Game: How inequality shapes our final years. Harvard University Press. 148 psges.
저자는 사회학자이며, 이 책은 저자가 2년반동안 참여관찰연구방법을 적용해 캘리포니아에 사는 노인들을 관찰하고 심층면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노인들이 어떻게 노년을 지내는지, 노인들의 젊은 시절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교육, 직업, 재산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서술한다.
미국에서 노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적 능력의 쇠퇴로 인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미국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젊은이들과 구분되는 열등한 지위의 존재로 취급되며, 사회의 전면에서 물러나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노인들은 거동할 수 있는 한 독립적으로 살면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요양원에 가는 것을 미룬다.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이라도, 그들의 삶에 젊은이는 거의 관여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미국의 노인들은 젊은이와는 유리된 그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대체로 젊은이들와 함께 어울려 사는 상황과 뚜렷이 구분된다.
미국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이 미비하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차를 직접 몰거나, 혹은 주위 사람에게 라이드를 부탁하거나, 정부에서 운행하는 복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돌아다니며 용무를 본다. 고령이 될 수록 이러한 수단들 모두가 점점 동원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상에 필요한 용무를 보는 것은 물론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사회적으로 단절되게 된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등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인간 관계망이 넓기 때문에 유사시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선을 여럿가지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인간 관계망이 좁고,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관료적 절차에 휘둘려 어렵게 어렵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노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동원하는 자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다. 중류층 노인이 사는 동네에는 공공 서비스가 잘되어 있다. 복지관의 셔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노인 대상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인에게 제공되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는 공공 서비스가 결핍되어 있으며, 노인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결여되어 있다. 즉 노인복지 환경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이 있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차이가 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관료나 의사를 상대하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수배하는 데 능숙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상대로부터 없수임을 당하며 힘들어 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며, 의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건강이 악화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과거에 의료계를 대하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고 게다가 돈도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들은 '몸은 자연이 알아서 치유한다는' 철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위하여 생활을 절제하기보다, 현재의 만족을 우선시하여 몸에 나쁜 행위도 꺼리지 않는다.
저자는 미국의 노인은 젊은 시절에 불평등한 지위와 경험이 노인 시기까지 연장되어 삶의 기회의 차이를 경험한다고 결론맺는다. 이는 노인이 되면 젊은 시절의 불평등의 영향력은 줄어들어 모두 삶이 비슷해진다는 가설을 부정한다. 육체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젊은 시절의 불평등에 관계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년기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젊은 시절의 불평등이 노인 시기까지 연장된다는 말이다. 저자는 곳곳에서 노인들 사이에, 몸에 대한 철학, 생각하는 방식, 태도와 동기 등과 같은 문화의 차이를 언급한다. 그러나 노인들 사이에 문화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젊은 시절의 교육,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가 노인들 간에 문화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노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문화를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별도의 독립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참여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노인들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미국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거의 전적으로 젊은이들에 치중되어 있기에, 이 책은 가치가 있다. 노인들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우울하게 만든다고 이 연구를 비판하는 미국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노년기는 우리 모두 거쳐야 할 시기이기에 외면할 수는 없다. 저자의 경력이 짧아서이겠지만, 반복이 많고 애매한 서술이 많다는 점은 흠이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간의 도덕률은 생물학적 본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 (0) | 2021.10.14 |
|---|---|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 질병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 2021.09.26 |
| 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싸울까 (0) | 2021.09.22 |

Kevin Kelly. 2010. What Technology Wants: Technology is a living force that can expand our individual potential - if we listen to what it wants. Penguin books. 359 pages.
저자는 Wired 잡지의 창간인이며 작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술은 자체의 발전 동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많은 예를 들면서 역설한다. 특정 기술은 기술 생태계의 일원이며, 기술 생태계는 생명체와 유사하게 진화의 과정을 밟으며 발전한다.
기술 생태계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기술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기술은 독립적으로 수행한 두 명 이상의 발명가가 유사한 시점에 특정 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예컨대 진화론은 다윈이외에 왈라스라는 사람에 의해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에디슨의 전구는 수십명의 발명가가 거의 동시에 유사한 발명을 하였다. 특정 기술은 이전의 여러 연관된 기술을 조합하여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거꾸로 보면, 여러 연관 기술이 존재하면 이를 조합한 다음 단계의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연이라는 말이다.
어떤 기술이건 항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 기술은 긍정적 이점이 부정적인 해악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기 때문에 출현한 것이다. 기술이 없는, 혹은 새로운 기술을 부정하는 반문명주의자들도 있지만, 크게보면 기술은 인간에게 더 많은 선택과 풍요를 가져 왔다. 인간은 기술의 발달을 거역할 수없다. 기술은 자체의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새로운 기술을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성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인류는 기술 발달을 거부하기보다는, 인간에게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발달의 방향을 잘 유도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 방향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전문적이되고, 더욱 넓게 보급되고, 인간의 자유와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더욱 아름답게 되는 방향이다. 특정 기술이 동반하는 문제는 새로운 기술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 보아야만 알 수있다. 왜냐하면 특정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리 예측할 수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여 이를 금하는 태도는,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기술의 발전 과정은 무한히 계속되면서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저자는 과거에 반문명적인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회 과정을 거쳐 결국 기술 낙관론, 기술 결정론으로 회귀하였다. 개인적인 일화와 독서를 망라하면서, 별반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 장황하게 서술하여, 읽어내리기 참 힘들었다. 결국 마지막 한두장에 이르러서는 저자의 장광설에 인내력이 고갈하였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질병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 2021.09.26 |
| 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싸울까 (0) | 2021.09.22 |
| 침팬지 정치학 (0) | 2021.09.20 |

Barbara Natterson-Horowitz and Kathryn Bowers. 2013. Zoobiquity: The Astonishing connection between human and animal health. Vintage books. 314 pages.
저자들은 심장병 전문의와 작가이며, 이 책은 인간과 동물이 질병에서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이유를 진화론으로 설명한다. 인간과 동물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동일한 병리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과 다양한 동물 종들의 질병을 비교하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있다.
인간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졸도하는 현상은, 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진대사가 극도로 낮아지면서 얼어버리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는 포식자에 대한 방어의 기제로 진화하였다.
암은 동물 세계에서 일반적이다. 세포가 복제하면서 유전자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다만, 몸집이 큰, 즉 세포의 수가 많은 동물이 몸집이 작은 동물보다 암의 발생 빈도가 반드시 높지는 않으며, 일부 동물에서 암이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유전자 복제의 오류만으로 암의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 복제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기제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동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양성번식하는 모든 동물은 성행위를 하며 오르가즘을 느낀다. 오르가즘은 동물이 성행위를 하도록 자극하는 촉매제이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생활에 문제를 가진 사례가 흔하다. 동물의 삶에서 생식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인간은 성을 감추지만 인간 역시 동물의 일부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성은 핵심적이다.
인간이 정신적 충격으로 심장이 멎어 죽듯이, 동물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 특히 포식자 앞에 공포의 상황에서 심장이 멎어 사망한다. 자연 세계의 동물은 계절의 변화나 먹이의 증감에 따라 살이 찌고 빠진다. 그러나 우리에 갖힌 동물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도하게 먹어 살이 찌거나 반대로 먹이를 먹지 않아 병적으로 마른다. 섭식장애를 보이는 인간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동물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됬을 때 자해 행위를 한다.
동물이나 인간 모두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독립된 성인의 단계로 이전하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동물이나 인간은 모험적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 시기에 이러한 행동은 직접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중요한 성장 과정이다. 청소년기는 모험적, 충동적 행동 때문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존에 필수적인 지혜를 획득하지 않으면 독립적 성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원균은 동물로부터 온 것이다. 많은 병원균은 다양한 동물 종을 옮겨 다니면서 변이를 거듭하다가 인간에게 온다. 동물 세계에 퍼지는 질병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근래까지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와 거의 소통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수의사를 깔보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의 질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사와 수의사의 협업은 의학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근래에 진화의학 evolutionary medicine 이 의료계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물과 인간의 공통 기전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책은 의사와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서인지, 읽기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선진국 사람들에게 주요한 질병 - 심장병, 비만, 성적인 문제, 마약, 병적 집착, 자해 행위, 성병- 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인간과 동물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사례들이 지나치게 많이 망라되어 있어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 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싸울까 (0) | 2021.09.22 |
| 침팬지 정치학 (0) | 2021.09.20 |

Charles Tilly and Sidney Tarrow. 2015. Contentiou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33 pages.
저자는 사회학자와 정치학자이며, 이 책은 제도 정치권 밖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인, 데모, 집회, 사회운동, 내전, 혁명, 등 포괄적 범주의 정치적 투쟁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다.
구조적 요인이 자연적으로 발화하여 정치적 투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왜 어떤 경우에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는가? 정치적 투쟁 중 어떤 것이 성공하여 제도 정치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왜 특정한 투쟁 행위를 채택하는가? 왜 어떤 투쟁은 평화롭게 전개되고, 어떤 투쟁은 폭력적이 되는가?
제도 정치권 밖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투쟁 행위는 기존의 정치 제도와 상호 작용하며 전개된다. 기존의 제도권 정치가 어떤 정치적 기회를 허용하는가에 따라, 제도 정치권 밖의 정치적 투쟁 방식도 달라진다. 국가가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정치적 투쟁은 평화적으로 전개되며 제도 정치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민권운동이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전개된 노예폐지 운동을 들 수 있다. 반면 국가의 통치력이 약하며 권위주의 정치가 전개되는 나라에서 정치적 투쟁은 폭력적인 방법을 취한다. 아프리카나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소수민족의 폭동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제도 정치권 밖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투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열기가 식고 잊혀진다. 정치적 투쟁은 처음의 발화 지점과 사람과 이슈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 다른 범주의 사람들, 연관된 다른 이슈로 확대될 때에 성공한다. 구체적으로 벌이는 투쟁 행위는 과거에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방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쟁이 전개되면서 상황에 맞추어 새로이 창안해내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의 민권운동에서 흑인 대학생들이 백인 전용 식당 좌석을 점거한 행위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서 노란 우산을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서 투쟁의 파장을 확대시켰다.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에서 정치적 투쟁은 계급간 갈등,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국가와 자본가 계급에 저항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정치적 투쟁의 주 이슈는 민족간 갈등으로 옮아갔으며, 근래에는 인종, 민족, 여성 등 소수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이 주를 이룬다. 근래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Occupy Wall Street 운동과 같이 계급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선진 산업국에서 새로이 일어나고 있으나,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는 정치적 투쟁이 국제적 연대와 모방을 통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중동의 이슬람 지하드 운동이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 환경운동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촉구하는 운동 등은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며 전개된다. 이는 세계화로 사람, 정보, 물자의 국가간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 집필되어 그런지 이야기의 흐름이 없이 단절적으로 서술하여 읽기 힘들다. 저자가 서두에서 제시한, 왜 어떤 경우에 정치적 투쟁 행위가 벌어지는지 하는 의문에 대해 책을 다 읽고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전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정치적 투쟁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나, 각 사례에 대해 한 두 쪽의 간단한 줄거리만 피상적으로 제시하여 별로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 질병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 2021.09.26 |
| 침팬지 정치학 (0) | 2021.09.20 |

Frans de Waal. 2007(1982). Chimpanzee politics: Power and Sex among Ape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15 pages.
저자는 동물행동학자(ethologist)이며, 이 책은 네덜란드의 침팬지 동물원에서 3년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저자는 침팬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개되는 사회 활동을 권력 갈등이라는 주제에 촛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침팬지들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를 연구자는 전지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서술한다. 침팬지들 사이의 권력 추구 행위는 인간의 가식이 벗겨진 상태에서 전개됨으로 훨씬 적나라하게 벌어진다.
이야기는 침팬지 집단의 최고 연장자 수컷인 예로인(Yeroen)이 위계서열의 정상을 차지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상하는 도전자인 류이트(Luit)에게 권좌를 빼앗긴다. 그러나 류이트의 권력은 몇 달 지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 도전자인 니키(Nikki)에게 권좌를 내주게 된다. 니키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예로인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그의 권력은 불안정하다. 예로인은 니키와 류이트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이 니키보다 명예와 섹스를 더 많이 차지하는 노회한 정치를 구사한다. 침팬지들은 평소에 서로 마주칠 때마다 지위 위계에 따라 굴종과 과시를 교환하는 의례를 수행하는데, 권력 관계에 변화의 조짐은 이러한 굴종의 의례의 변화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난다. 예로인의 권력이 류이트에게 넘어가서, 굴종 인사를 하는 측이 류이트로부터 예로인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거의 반년이 소요되었다.
침팬지 집단은 성인 수컷 4명, 성인 암컷 10여명, 청소년과 아이들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지위는 연령, 권력의 연합 관계(coalition), 물리적인 힘, 지혜와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힘이 가장 센 침팬지가 반드시 위계 서열에 가장 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수컷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암컷은 집단의 화목을 추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한다. 예컨대 권좌를 차지한 수컷은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사소한 이익을 넘어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반면, 암컷은 개인적 선호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암컷들 사이에도 지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컷들 만큼 지위 추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지위 갈등의 빈도가 훨씬 덜하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물리적 힘과 함께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지지에 의존한다. 암컷들은 특정 수컷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지 세력이다. 권력의 찬탈을 도모하는 수컷은, 암컷들을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공을 많이 들인다. 권좌에 있는 수컷은 항시 다수의 암컷의 지지를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예로인은 니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인데, 젊고 거칠어서 암컷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니키보다 암컷들로 부터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한다.
약자들 사이에 연합을 통해 강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행위는 항시 관찰된다. 예로인이 권좌에 있을 때, 류이트와 니키가 연합했으며, 류이트가 권좌를 차지했을 때 예로인이 니키와 연합했으며, 니키가 권좌에 있을 때 예로인은 공식적으로는 니키와 연합하고 때때로는 류이트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양 쪽을 번갈아 이용함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로 했다. 또한 니키와 류이트는 예로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섹스를 할 때만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서, 예로인을 견제하였다.
섹스의 권리는 권력 위계와 동전의 양면이다. 수컷 사이에 권력 위계에 따라 섹스의 빈도가 비례적으로 분포한다. 니키보다 예로인이 섹스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공식적 지위와는 별개로 실질적 영향력에서 예로인이 니키를 앞섬을 의미한다. 아이러니는, 예로인이 세명의 수컷 중 섹스빈도가 가장 높지만 그는 성불구이므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예로인을 포함한 침팬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수컷에게 섹스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암컷이 결정한다. 암컷은 수컷보다 체구가 작고 약하지만 수컷이 암컷을 섹스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암컷의 의지를 거슬러 수컷이 강제로 섹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수컷은 그들 사이에 권력 갈등 때문에 암컷의 감정에 거슬리는 행위를 꺼려한다. 수컷이 암컷과 아이들을 심하게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수컷은 그들 사이에서와 달리 암컷을 심하게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하더라도 송곳니가 아닌 앞니만을 사용하므로 상처가 깊지 않다.
침팬지들 사이에는 행위 규범이 존재한다. 수컷은 암컷이나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다. 수컷들 사이의 싸움에서도 다리나 팔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머리나 어깨와 같이 치명적 해를 입히는 공격은 하지 않는다. 침팬지들은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여 전략을 짜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는 기만 행위를 구사하는데 능하다. 평소에 도움을 주고받는 계산적 행위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한다. 침팬지들은 수컷은 물론 암컷도 개개인의 성격에 차이가 크다. 섹스를 거부하고 동료 암컷보다 수컷과 주로 어울리는 수컷같은 암컷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이 크고 지혜를 발휘하는 노련한 암컷이 있다. 일생동안 한결같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유대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편을 바꾸는 약한 유대도 있으며, 외톨이 암컷도 있다. 수컷들 사이의 관계는 항시 긴장이 바닥에 깔려 있다. 언제건 수컷들 사이에 연합이 바뀌면서 권력의 위계가 바뀔 위험이 있다. 저자는 후기에서, 이 책이 포괄하는 관찰 기간 이후에 침팬지 집단에 새로운 권력 교체가 발생했다고 간단히 언급한다. 그 동안 거의 무시당했던 젊은 수컷인 댄디가 예로인의 도움으로 니키로부터 권좌를 찬탈한 것이다. 그 결과의 충격으로 니키는 물에 뛰어 들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예로인으로부터 권좌를 찬탈했던 류이트는 니키와 예로인의 공격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었다. 예로인은 노회한 정치가 답게, 시일이 흐른뒤 늙어서 자연사했다.
저자는 침팬지의 사회활동을 서술하면서, 인간들 사이의 행위와 대비하여 흥미롭게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한다. 침팬지들의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저자의 촛점이 뚜렷한 서술 능력이 설득력을 높인다. 저자는 이 책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심지어 미국의 국회의원들 사이에 필독서로 추천되었다. 책이 처음 나온지 40년이나 되었는데, 수십 판을 거듭하면서 유명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과일나무 > 호두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악 산업의 경제적 분석 (0) | 2021.10.08 |
|---|---|
| 인생의 마지막 역시 불평등하다 (0) | 2021.09.30 |
| 기술발달은 필연적이다. (0) | 2021.09.29 |
| 질병에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 2021.09.26 |
| 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싸울까 (0) | 2021.09.22 |
모과나무 목록
2021.1.1 ~2021.9.18.
1.
Sara Harper. 2016. How Population change will transform our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77 pages.
2.
David P. Barash. 2018. Through a Glass Brightly: Using Science to see our species as we really are. Oxford University Press.
3.
Alan Macfarlane. 2014. Invention of the Modern World. The Fortnightly Review. 322 pages.
4.
Calestous Juma. 2016. Innovation and its enemies: Why people resist new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316 pages.
5.
Dean Karlan and Jacob Appel. 2011. More than good intentions: Improving the ways the world's poor borrow, save, farm, learn, and stay healthy. Plume Books. 276 pages.
6.
Fredrik Erixon and Bjorn Weigel. 2016. The Innovation Illusion: how so little is created by so many working so hard. Yale University Press. 238 pages.
7.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231 pages.
8.
Samuel Huntington. 2006(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461 pages.
9.
Roburt Kuttner. 2018. Can Democracy survive global capitalism. W.W.Norton. 309 pages.
10.
Richard Baldwin.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Belknap. 301 pages.
11.
Michael J. Sandel.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227 pages.
12.
Johan Norberg. 2020. Open: The Story of Human Progress. Atlantic Books. 382 pages.
13.
Joel Mokyr. 1990. The Lever of Riches: Technological creativity and economic progress. Oxford. 304 pages.
14.
Benjamin Friedman. 2005.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Vintage books. 436 pages.
15.
Charles Goodhart and Manoj Pradhan. 2020.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Ageing societies, waning inequality, and inflation revival. Palgrave Macmillan. 218 pages.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97 pages.
16.
Joel Mokyr. 2002. The Gifts of Athena: Historical orgins of the knowledg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97 pages.
17.
Robert Bates. 2010. Prosperty and Violence: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Norton. 98 pages.
18.
Kevin Simler and Robin Hanson. 2018. The Elephant in the Brain: Hidden Motives in Everyday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313 pages.
19.
Martin Seligman.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Vintage. 292 pages.
20.
Mauro Guillen. 2020. 2030, How today's biggest trends will collide and reshape the future of everything. St.Martin's Press. 242 page.
21.
Ronald Inglehart. 2018. Cultural Evolution: People's motivations are changing, and reshaping the world. Cambridge. 216 pages.
22.
Cesar Hidalgo. 2016. Why Information grows: The Evolution of order, from atoms to economies. Basic Books. 181 pages.
23.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379 pages.
24.
Martin Daly and Margo Wilson. 1988. Homicide. Aldine de Gruyter. 297 pages
25.
Robert Trivers. 2011. The Folly of Fools: The Logic of deceit and self-deception in human life. Basic Books. 340 pages.
26.
Stuart Firestein. 2012. Ignorance: How it drives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76 pages.
27.
Richard Haass. 2020. The World: A Brief instroduction. Penguin Press. 313 pages.
28.
Douglas Kenrick. 2011. Sex, Murder, and the meaning of life: A Psychologist investigates how evolution, cognition, and complexity are revolutionizing our view of human nature. Basic Books. 205 pages.
29.
Bobby Duffy. 2018. Why we're wrong about nearly everything: A theory of human misunderstanding. Basic Books. 241 pages.
30.
Geoffrey West. 2017. Scale: The Universal laws of life, growth, and death in organismx, cities, and companies. Penguin Books. 448 pages.
31.
Martin Daly and Margo Wilson. 1983. Sex. Evolution, and Behavior. Willard Grant Press. 344 pages.
32.
David Buss. 2019.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Routledge. 402 pages.
33.
William Baumol, Robert Litan, and Carl Schramm. 2007. Good Capitalism, bad capitalism, and the economics of growth and prosperity. Yale University Press.
34.
Annalee Saxenian.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168 pages.
35.
Mark Zachary Taylor. 2016. The Politics of Innovation: Why some countries are better than others at science and technology. Oxford. 297 pages.
36.
Ian Morris. 2013. War! What is it good for?: Conflict and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from primates to robots. Farrar, Straus and Giroux. 393 pages.
37.
James Bessen. 2015. Learning by Doing: the Real connection between innovation, wages, and wealth. Yale University Press. 227 pages.
38.
Sherwin Nuland. 2007. The Art of aging: a Doctor's prescription for well-being. Random House. 290 pages.
39.
Jeffrey Winters. 2011. Oligarc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5 pages.
40.
Alvin Roth. 2015. Who gets What - and Why: the new economics of matchmaking and market design. Mariner Books. 231 pages.
41.
William Easterly. 200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Economists'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in the tropics. MIT Press. 291 pages.
42.
Robert Paxton. 2004. The Anatomy of fascism. Vintage books. 220 pages.
43.
Joseph Stiglitz. 2019. People, power, and profits: progressive capitalism for an age of discontent. 247 pages.
44.
Mancur Olson.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237 pages.
45.
Charles Tilly.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Blackwell. 227 pages.
46.
Amar Bhide. 2000. The Origin and Evolution of New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370 pages.
47.
Sonja Lyubomirsky. 2007. The How of Happiness: a new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Penguin press. 304 pages.
48.
Geoffrey Parker, Marshall Van Alstyne, and Sangeet Choudary. 2016. Platform Revolution: How networked markets are transforming the economy and how to make them work for you. W.W.Norton. 289 pages.
49.
David Evans and Richard Schmalensee. 2016. Matchmakers: the New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6 pages.
50.
Valcrav Smil. 2021. Grand Transitions: How the modern world was made. Oxford University Press. 296 pages.
'과일나무 > 모과나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류의 물질문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0) | 2021.09.18 |
|---|---|
| 플랫폼의 성공 조건 (0) | 2021.09.14 |
| 플랫폼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0) | 2021.09.12 |
| 행복해지는 방법 (0) | 2021.09.08 |
| 창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0) | 2021.09.04 |



